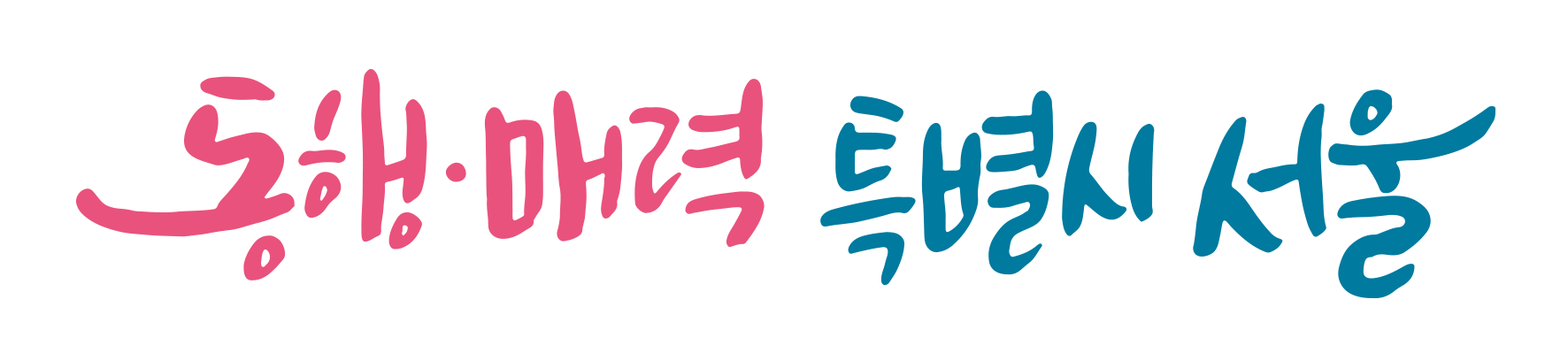소통공간
100개의 전공
| [인문사회] 심리학과 - 확률과 통계, 잘 해야 하나요? |
|---|
  방OO 방OO심리학과에서는 계산이나 통계를 낼 때 고등학교때 배운 확률과 통계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확률과 통계를 너무 못하는데 다른 학과를 찾는게 좋을 정도로 지장이 있을까요?  앵포 (전공: 심리학과) 앵포 (전공: 심리학과)오히려 해석하고 읽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운 것과는 다른 통계 지식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지금의 확통을 못한다고 해서 미래에 통계 또한 못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통계 수업은 1개만 존재합니다. 그 외에 과목은 고대에서는 잘 열리지 않는 편입니다. 학교마다 열리는 수업이 다르니까, 수업 과목을 먼저 보고서 통계를 적게 사용하는 곳을 가도 좋을 것 같아요. 고등학교 통계와는 다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런데 그 통계를 읽는 것도 고등학교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. 고등학교 통계랑 느낌이 다릅니다.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심리학과에 지원해도 좋을 것 같아요  철규 (전공: 교육심리) 철규 (전공: 교육심리)친구 안녕! 통계를 어려워하는 게 진로에 영향이 있을까 고민하는구나.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속상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돼. 하지만 이 고민의 답이 명확히 ‘아니요. 지장 없습니다!’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의 미소를 상상하며 기쁘게 답할게. ‘고전시가에서는 운율을 중시하고 근대문학에서는 시대상을 중시한다.’ 라는 결론이 나왔어. 우리는 이런 차이점을 알아내는 과정을 수치로 설명할 수 있을까? 아니야. 하지만 만약 화학과에서 ‘칼슘과 칼륨의 섞일 때 일어나는 온도변화를 칼슘의 농도를 변화시키며 관찰’ 이라는 연구에서 ‘칼슘과 칼륨의 비율이 1:9 일 때, 용액의 온도는 0 ℃이고, 2:8이면 5 ℃로 상승했다.’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 결과를 수치로 만들 수 있을까? 가능하지. 예를 들어 심리학과에서 ‘보유한 옷의 수와 패션에 대한 관심도의 관련성’이라는 주제의 연구에서는 ‘옷이 10벌 미만인 경우 패션에 매우 관심 없다는 응답이90%, 옷이 11벌 이상 20벌 미만인 경우 패션에 매우 관심 없다는 응답이 80%’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.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는 건 사회과학 분야의 공통적인 특징이지. 하지만 학부생(대학교) 과정에서는 통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히 배우고 석, 박사생 (대학원)에서 직접 연구를 설계하며 통계를 사용하게 돼. 학부과정은 ‘계산기의 +는 더하기이고 1+1을 입력하면 2라는 결과가 나온다. 이것이 계산기의 사용법이다.’ 배우고, 석박사 과정은 ‘A를 연구한 결과가 1이고 B를 연구한 결과가 1인데 이 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더하기를 사용해야 적합한 방법이야. 1+1을 계산기에 누르자.’를 배워. 간단하게 기초와 응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지. 관련되었다 해도 대학생 때는 통계를 많이 배우지도 않으며, 대학원 때 통계를 사용할 때는 이미 통계가 능숙 할 것이다! 가 나의 답변이야. 친구가 통계라는 과목 때문에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랄게.. |
 첨부파일 첨부파일 |